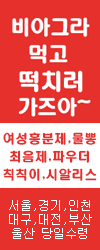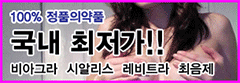주차때문에 만난 연상녀 - 하ㅋ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0-01-17 20:57본문
“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 아니야 상욱씨 우리 여기 까지만 하자 응 나 무서워”
인숙이 상욱의 머리를 쓰다듬고 상욱은 인숙의 어깨를 잡고서는 조금의 공간을 만들면서 다시 인숙의 얼굴을 잡고 있었다.
상욱의 두손에 잡힌 인숙의 얼굴은 발르레 홍조를 띠며 인숙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인숙의 입술을 다시 한번 감싸는 상욱의 입술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인숙의 입술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인숙의 팔에 힘이 빠지며 풀어지면서 상욱과 동시에 쓰러지고 욱의 손은 다시 한번 인숙의 가슴을 공략하고 있었다.
상욱의 손이 가슴위로 돌때마다 상욱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인숙의 유두는 점점 딱딱해지며 오히려 상욱의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있었고 상욱은 이내 인숙의 상위 옷들을 전부 풀어 놓고 있었다.
좌우로 쳐지지 않은 인숙의 봉긋한 가슴이 드러나면서 인숙의 입술을 점령한 상욱은 인숙의 목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
거친 호흡의 인숙은 눈만 감은체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체 상욱의 머리만을 쓰다듬고 있었다.
목선을 타고 내려온 상욱의 입술은 그래도 좌우로 나누어진 인숙의 가슴은 양손으로 모아서는 한입속으로 물고 있었다.
인숙의 입에서 가려린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 어…헉”
혓바닥으로 인숙의 유두를 간지럽히자 인숙의 다리가 꼬여져가고 인숙은 더 강하게 상욱의 머리를 위로 잡아당기듯 당기고 있었고 이내 인숙은 상욱의 머리 뒤쪽으로 손을 집어 넣서는 상욱의 목아래 어깨와 이어진 부분을 만지더니 상욱의 면티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인숙에 의해 벗겨진 상욱의 면티는 힘없이 던져지고 인숙은 상욱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몸을 앞으로 당겨 상욱은 조슴스레 츄리닝을 조금 내리고서는 인숙의 손을 잡고서 방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다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인숙의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당기고 있었다. 상욱의 손에 이끌려 인숙은 뜨거운 무언가를 잡고서는 감고 있던 두눈을 뜨고 말았고 인숙은 이제는 더 이상 거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 상욱씨 잠깐만 응 잠깐만”
인숙에 말에 하던 동작을 멈춘 상욱이 누워 있는 인숙은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전히 상욱의 가운데를 잡고 누워 있는 인숙이 빙그레 미소를 지우며 상욱을 쳐다 보다가 몸을 일으켜 앉고 있다.
인숙이 앉는 바람에 엉거주춤 반쯤 바지를 내린 체 무릎을 꿉힌 상태로 일어서는 상욱은 계면 적은지 고개를 숙인체 바지를 치켜 입으려고 하고 있었다.
“ 상욱씨 나좀 봐봐”
“……”
“ 나 있잖아 상욱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나 무서워 그리고 나….”
인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체 상욱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상욱의 얼굴을 보고 있는게 아니라 아직 치켜 올라가지 않은 상욱의 육봉을 바라보고 있었다.
“ 대신…..”
인숙은 자신의 몸을 상욱의 앞으로 당겨서는 상욱의 단단함을 잡아 보기 시작 했다.
부드럽게 감아진 손은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며 인숙은 흐트러진 머리를 한손으로 쓸어서는 넘기고는 천천히 상욱의 중심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인숙의 뜨거운 입김이 상욱에게 닿는 순간 상욱은 움찔하며 팽창을 하고 있었고 이내 인숙은 입술을 모아서는 상욱의 중심부에 입술을 맞추고 었었다.
손을 움직일때마다 육봉의 머리는 반짝이며 거대한 머리를 내놓고 인숙은 그때마다 혓끝으로 간지럽히고 있었다.
엉거주춤 앉아 있던 상욱이 힘에 겨운지 옆으로 몸을 돌리면서 떠?인숙은 상욱에 다리에 반쯤 걸쳐진 바지를 마져 내리고는 그다리사이에 앉아서는 엎드린 체 얼굴을 아래위로 흔들고 있었다.
상체를 반쯤 든체 상욱이 양손을 내려서는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인숙의 가슴에 손바닥을 대본다 인숙이 움직일 때 마다 상욱의 손바닥은 작은 간지럼이 쏟아지고 있었고 입에 육봉을 문 체 인숙이 조금씩 신음소리를 빼아내고 있었다.
양손으로 상욱의 허벅지를 어루만지는 인숙 그런 그녀의 손길에 상욱의 다리는 좌우로 벌어지다가 이내 바닥에서 떨어져서는 무릎을 꿉힌 체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
인숙이 상욱의 엉덩이를 받치듯 들고는 상욱의 주머니를 혀끝으로 간지럽히자 상욱은 몸을 움찔하며 얇은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상욱의 몸은 점점 힘이 들어가며 팽창을 하자 인숙은 상욱의 다리를 모아서는 그위에 올라 타고는 손을 말아쥔 체 상욱의 육봉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의 다리위로 인숙이 치마를 올린 체 올라와 움직이자 상욱에게 인숙의 팬티의 질감이 전해지고 있었고 곧이어 무릎위로 인숙의 축축하며 따뜻함이 전해지고 있었다.
인숙의 손이 빨라지며 질수록 그축축하고 따뜻함은 더해져가고 있었고 상욱은 무릎에 힘을 실어 자주 인숙의 팬티를 압박하고 있었다.
상욱이 무릎에 힘을 주어 들 때마다 움찔이는 인숙은 더 빨리 손을 움직이고 있었고 상욱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면서 미간이 좁아지며 발가락이 안으로 꼬여져가고 무릎안쪽으로 힘이 들어가며 푸른 실핏줄이 선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었다.
으윽하는 소리와 함께 등이 활처럼 휘어지다가 끈끈하고 하얀 액체를 분출하는 상욱에게 그뜨거움이 더해지며 손에 묻는 것을 아량곳 하지 않은체 인숙은 마저 남은 애액마저 뽑아 내려는듯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긴한숨을 쏟아 내는 상욱과 인숙은 잠시 그대로 모든 것을 정지한체 있다가 인숙이 일어나며
“ 밖에 수건 있지 상욱씨”
하고 묻고 상욱은 누운체 고개만 끄덖이고 있었다.
허무함이 감돌기 보다는 아쉬움이 남는 상욱은 나체로 그대로 누워있었고 인숙이 수건을 적셔 가지고 방에 들어서며 누워있는 상욱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팔을 뻗어 서있는 인숙의 다리를 상욱이 만지자 인숙이 싫지는 않은지 상욱의 옆에 앉으며 조금전 화산처럼 분출한 상욱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다.
무릎 안쪽을 만지던 상욱은 좀더 손을 뻗어서는 옆으로 앉아 있는 인숙의 허벅지를 매만지고 있었고 인숙은 그저 미소로만 상욱을 쳐다 보고 있었다.
아마도 인숙은 상욱이 분출을 했기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상욱이 하는대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상욱이 점점 허벅지 안쪽을 파고 들자 인숙은 상욱의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씩 벌려 주었고 상욱은 이내 축축하게 젖은 팬티 앞쪽까지 다가 설 수 있었다.
상욱의 손가락이 팬티앞쪽을 건드리자 움찔하며 엷게 눈을 흘기면서도 인숙은 웃고만 있었다.
상욱은 손바닥으로 인숙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이내 손가락으로 팬티를 뼛“茨는 인숙의 중심부에 손가락을 대보고 있었고 인숙은 상욱의 중심부를 잡은체 엷은 신음소리를 曇틂뺐?있었고 촉촉함이 상욱의 손가락에 전해지며 인숙은 상욱의 육봉을 더 강하게 잡고 있었다.
“ 아…아,,,”
누워있는 상태의 상욱이 한손으로 인숙의 치마를 파고 들며 인숙의 팬티를 벗겨 내려하자 인숙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지만 그녀의 몸은 인숙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욱은 편하게 인숙의 팬티를 끌어 내 릴 수 있었다.
“ 미워 상욱씨”
상욱이 팬티를 끌어 내리자 이내 앉아 버리는 인숙은 마저 팬티가 자신의 다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한쪽으로 오므리고는 상욱이 쳐다보는 각도에 맞추어 무릎을 모아서는 살짝 벌려주고 있었다.
어두운 치마속에 드러나는 인숙의 중심부는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상욱의 손끝에 밀림의 감촉이 전해지며 상욱은 인숙의 옥문을 살살 문지르며 인숙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옥문의 닭벼슬을 좌우로 버리며 상욱은 가운데 손가락을 촉촉히 젖어 있는 옥문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부드럽게 옥문이 열리며 상욱의 손가락을 맞이하는 육봉을 잡고 있던 손이 뒤로 뽀賤嗤庸 인숙은 뒤로 넘어가고 있었고 상욱은 몸을 일으켜서는 마지막 남은 인숙의 치마를 벗겨내고는 인숙의 다리를 좌우로 벌리고서는 그사이에 앉아서 그녀의 처녀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 이뻐”
인숙의 밀림을 쓸어 올리며 이쁘다고 내鍛?상욱은 상체를 숙이더니 인숙의 닭벼슬에 입을 맞추고서는 아주 깊게 빨아 들이고 있었다.
인숙의 닭벼슬이 상욱의 입술에 빨려 들어가면서 인숙의 옥문은 둥근 모양을 갖추고서는 맑고 투명한 이슬을 내놓고 있었다.
상욱이 인숙의 옥문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천천히 인숙을 타고 올라가서는 인숙을 바라 보고 있었다.
상욱의 눈은 인숙에게 무언가를 갈망하듯 말을 하고 있었고 인숙이 상욱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체 깊은 입맞춤을 하고 있을 때 상욱의 육봉은 인숙의 옥문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한순간에 달이 떠오르며 화산이 터지듯 상욱은 인숙의 몸안을 거침없이 파고 들고 있었고 인숙은 온몸을 상욱에게 감은체 매달리고 있었다.
양손을 바닥에 의지한체 상욱의 허리돌림은 시작되었고 인숙역시 상욱에게 동조를 하듯 조금씩 옥문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며 상욱의 온몸을 잡아주고 있었다.
상욱의 몸이 파도를 타듯 아래에서 위로 휘어지며 올라가고 인숙은 흔들리는 몸을 고정 시키듯이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듯이 지지하다가도 상욱의 목을 감기를 수차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도 없이 두사람은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인숙의 몸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상욱의 맛이 아쉬운지 인숙의 옥문의 대문은 여러차레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상욱을 잡고 있었고 상욱 역시 드나듬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긴 한숨과 함께 누워 있는 두사람은 천정을 바라보며 살그머니 손을 잡아보고는 얼굴을 돌려 마주 쳐다보고는 다시 입맞춤에 빠져 들고 있었고 이 두사람 위로 열린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