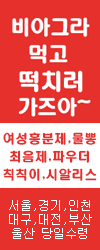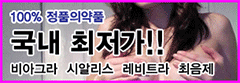주리의 고백 - 18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0-01-17 14:03본문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피곤하고 졸립고 짜증나고 불안하며 묘한 기대감에 가슴 울렁증도 여전하였다.
젖탱이가 탱탱해지고 아팠다. 소피를 보고나도 개운치 않았고
먹기는 싫은데 뱃속에 든 것도 없을텐데 수시로 설사가 났다.
발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시큼한 음식이 간절하고
생리까지 없어졌다. 오진일 수도 있었다.
다른 병원에 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러다 어느 날 강아지가 스믈 스믈 기어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됐다. 꿈도 꾸었다.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았다.
랑이의 좋아하는 모습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상상 임신이란 진단을 받고 나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먹기도 싫고 돈 벌기도 싫었다. 꼼짝하기 싫었다.
일주일 동안 방안에서 랑이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잠만 퍼질러 잤다. 물론 가게 문도 열지 않았다.
달봉이를 만나라는 여주인의 명령도 두 번이나 묵살했다.
몸이 반쪽이 되었다. 그동안 밀감은 원 없이 먹었다.
일주일 만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장기간 문을 걸어 잠궜더니 단골들도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나 보다.
영감만이 멀리서 가게를 아니, 나를 지켜 볼 뿐이었다.
여주인이 가게 문을 연 것을 알고 달봉이 만나
재미도 보고 기분 전환도 하라는 명령을 했지만,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가게를 아니, 나를 종일 노려보는 영감 옆을 지나쳤다.
이유 없이 미웠다. 그리고 싫었다. 얼굴에 침을 칵 뱉아 주었다.
영감은 침을 맞고도 닦지도 않고 그대로 서서 나를 보고만 있었다.
돌아서 오면서 후회도 했다. 영감이 나에게 무엇을 잘 못 했나?
선물도 주고 웃음도 주고 실적도 올려 주고 엎드려 절을 올려야 도리였다.
여주인이 냉정하게 대하라 했다고 천추에 한 이라도 맺힌 것처럼 멸시해야 하는 가.
‘늙은 것이 어디를 넘 봐?’
영감이 언제 내 몸뚱아리 만져 보길 했나. 먹고 싶다고 했나?
그냥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 온 죄밖에 없는데.
글구, 까짓 거 깨끗하지도 않은 몸뚱아리 한번 주면 어떤가?
연못에 돌 던져 봐야 퐁당 소리밖에 더 나겠는가?
내가 한 번 주면 영감은 얼마나 황홀해 하고 행복해 할까?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 노는 것을 구경했다.
아이들 노는 것이 강아지 뛰어 노는 것으로 보였다.
신랑은 줄을 풀어 주었는데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 종아리며 무릎을 부지런히 핥고 있었다. 씹하고 싶다는 표시인가?
나는 거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치마 밑에 머리가 들어오면 말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 거리고 손가락질도 하고 지들끼리 쑤근대기도 했다.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깨갱’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지나가던 고교생 둘이 있었다. 한 놈이 실수인척 신랑을 걷어찬 것이었다.
나는 발딱 일어섰다. 그들을 향해 악을 썼다.
“야, 개새끼야. 발목을 비틀어 꺾어 버릴 놈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히히덕대며 가고 있었다.
나는 양손에 모래를 쥐고 달려가 신랑 찬 녀석 뒤통수에 뿌렸다.
그들이 돌아 섰다.
“아줌마,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그 짓하면 돼요? 집구석에 처박혀 해야 쥐.”
“”개쌔끼야, 내가 뭐 했는데. 니 좆이라도 빨았냐?“
개의 마누라가 사람보고 개새끼라고 욕하고 있었다.
사람이 개를 찼다고 암캐가 짖으며 달려들고 있었다.
“눈 꼴 시럽쟎어.”
녀석도 슬슬 열을 받는 모양이었다.
한명은 미친년 상대 말고 가자고 친구를 막아섰다.
해거름이라 사람들은 없었다. 아이들도 놀라서 모두 달아나고 없었다.
나는 신랑찬 녀석과 엉겨 붙었다. 육탄전이 벌어질 찰라였다.
“야, 애들 지들 집에 가서 어른들 델고 나오면 구경꺼리 돼. 그만가자.”
이미 붙어버린 싸움이었다. 내가 놈의 옷을 꽉 잡고 있었으니 갈래야 갈 수도 없었다.
신랑을 차지 않은 학생이
“자리 옮기자. 사람들 모이면 챙피다. 들어.”
두 놈이 나를 달랑 들어 올렸다. 그리고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
신랑은 뒤쫒아 오면서
“멍 멍...”
짖기만 했다.
그들이 나를 안고 간 곳은 공사장이었다.
퇴근을 했는지 공사가 중단 됐는지 인적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오늘 내가 여기서 이놈들에게 맞아 죽던가, 따먹히던가
하여간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했다.
신랑은 저만치서
“컹 컹...”
짖기만 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살려 주세요오. 잘 못 했어요오.”
둘은 마주보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 봤다. 나는 더욱 애절하게 용서를 빌었다.
“미친년 아냐? 이거.”
한 놈이 내 머리에 침을 칵 뱉고 돌아섰다.
다른 놈도 침을 뱉었는데 내 허벅지를 적셨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신랑에게 어깨띠를 두르고
그들의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집에 와서 신랑과 함께 목욕을 했다.
목욕하고 저녁도 챙기지 않고 이부자리부터 폈다.
또 자고 싶었다. 만사가 귀챦았다.
네다리 쭉 뻗고 누워 있는데 신랑이 내 젖을 핥아 주었다.
배꼽도 핥아 주었다. 가랑이까지.
나는 뜨거워지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뒤틀며 침을 흘리다가
엉덩이 밑에 쿠션을 두 개 받쳤다.
역시나 신랑은 혀로 내 사타구니를 흠뻑 적셔놓고 삽입을 했다.
나는 그 밤도 극도의 흥분 속에 숨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며
신랑이 세 번 사정하는 동안 2시간 넘게 끌려 다녔다.
또 열흘이나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외출을 하라는 여주인의 명도 두 번이나 거역했다.
차츰 임신 증세가 없어지고 있었다.
여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면서 최후통첩을 했다.
“이번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까발리겠다.”
협박이 무서워서는 아니었다. 점차 정신을 수습하고 있었다함이 옳겠다.
더 이상 여주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말 잘 듣는 암캐로 돌아가고 싶었다.
여주인이 내린 명령은 가게와 집을 보름 안에 처분해서
돈을 통장에 넣어 놓고 보고 하라는 것이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못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훌륭히 수행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소임이고 도리이니까.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