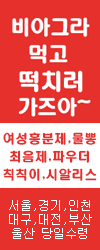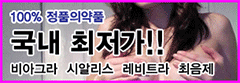Dogs in the house - 1부 2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76회 작성일 20-01-17 14:33본문
Dogs in the house - Living room
“수캐랑 교미를 그렇게 해댔는데도 임신 하나를 제대로 못 하나.”
암캐의 검은 눈동자에 두려움이 가득 차오른다.
“각오는 돼 있겠지.”
주인은 회초리 끝을 잡고 가볍게 힘을 준다. 휘어지는 것을 보니 물푸레나무 같다.
회초리를 허공에 한번 휘두르자 가벼운 소리가 난다.
소리가 신호였는지, 암캐는 몸을 돌려 엎드리고는 엉덩이를 높게 들어 자세를 잡는다.
휘익, 찰싹.
암캐의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잡힌다. 고통인지, 쾌락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다.
회초리가 계속해서 그런 암캐의 엉덩이 위로 떨어진다. 날카로운 파열음.
암캐는 희미하게 몸을 떨며 눈을 감는다.
애처롭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연분홍색 혀끝이 보인다.
스팽이 계속되었다. 암캐의 하얀 엉덩이 위는 어느 새 붉고 긴 흔적들로 덮여 간다.
처음에는 엉덩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점 허벅지 아래로까지 넓어진다.
회초리가 멈추었을 때, 나는 암캐의 엉덩이와 무릎 위쪽 허벅지에 붉은 자국이
가득 남은 것을 보았다. 하얀 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푸레나무가 아무리 연하고 잘 휜다고 해도 이 정도면 내일 아침 멍에 열상에
온통 너덜너덜해질 것 같았다. 주인은 그런 암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회초리로
이리저리 쓸어내린다. 으으, 하는 가는 신음소리가 암캐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암캐는 애원하는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본다. 스팽으로 호흡이 거칠어진 주인은
그런 암캐를 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마지막 한 번이야.”
주인의 누그러진 목소리에 암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진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다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쁜 것 같다. 주인이 회초리로
암캐의 허벅지 옆을 탁탁 친다. 그게 신호였는지 암캐는 네 발로 기어
쇼파 앞의 낮은 테이블에 덥썩 몸을 얹는다. 배와 가슴이 유리판에 닿아
차가울 텐데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눈치다.
주인은 탁자 위에 상반신을 얹고 엉덩이는 높이 든 암캐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아까 회초리를 꺼냈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 긴 로프를 꺼냈다.
그리고 마치 짐짝을 고정하듯 탁자와 암캐를 둘둘 감기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암캐의 등 과 허리 사이에서 X자로 만나는 모양이기는 하나,
정성을 들인 본디지란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냥 말 그대로 암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것이 목적인 듯 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암캐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닥쳐. 개년아.”
그리고 그제야 주인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나를 의식한 행동이다. 주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얼굴에 정면으로 꽂힌다.
“차 한 잔 하실까요.”
나는 서둘러 네, 하고 대답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큼, 하고 헛기침을 하며 나는 그제야 깨닫는다. 집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내내 무섭도록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인은 부엌으로 간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가 하는 행동은 쇼파에 앉은 나에게 그대로 다 보였다.
전기포트로 물을 데우며 주인이 물었다.
“커피? 녹차?”
나는 아무거나 달라고 했다. 잠시 후 그가 나에게 건넨 머그컵 안에는
따듯한 커피가 들어있었다. 주인의 손에도 머그컵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서 있었고 나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뭘 마시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그렇게 선 채로 탁자에 묶여 가볍게 할딱이는 암캐를 내려다보았다.
나도 그와 같이 암캐의 엉덩이를 바라봤다.
훤하게 드러난 보지와 똥구멍이 가끔씩 움찔거린다.
“난 애기 보지를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얘기에 놀란 나는 잔에서 입을 뗐다.
“아주 어린 보지는 제대로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꼬막 같지요.
뽀얗고 통통한 그걸 희롱하면서 가끔 손끝으로 입구를 벌려 주면,
대부분의 경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래요.
너무 어린 건 범할 수가 없지요. 적어도, 여섯 살은 되어야.
그 정도는 되어야 삽입이 되지요.”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다. 커피의 쓴 끝 맛이 역하다.
주인은 차를 한 번 홀짝이고는 말을 이었다.
“삽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짓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윤활젤을
써야 합니다. 공이 많이 들죠....... 손가락으로 넓히기 시작하긴 하는데,
어른 손가락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것에게 직접 자기 손가락을 넣게 하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마침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고...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린 보지는 개통할 준비가 다 된 거죠.”
나는 몸을 숙여 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십중팔구 피가 납니다. 성숙하지 않은 몸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꽉 끼는 질을 맛보면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암캐는 아무리 어려도 암캐라는 걸....... 모리씨.”
그가 날 부르는 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가느다란 어린 것이 신음을 내면서 허리를 흔드는 장면을 상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조련하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이면 됩니다.
물론, 그 옆에는 어린 것의 어미도 있겠지요. 주인에게 딸년의 보지를 바친
행복한 암캐. 딸의 보지를 범하는 주인의 자지를 보면서 쾌락에 몸을 떨고 있을 암캐.......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암캐를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려는 겁니다.
암캐 몸에서 나고, 핏덩이 때부터 철저히 암캐로 교육받은, 뼛속까지 암캐인
육변기를 기르기 위해서.......”
주인은 말을 끊고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역겹지요?”
차고도 뜨거운 것이 확 얼굴로 치솟는다. 얼굴을 찡그리며 내가 말했다.
“네. 토할 것 같아요.”
주인이 입을 크게 벌려 웃는다. 별다른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몹시 유쾌해 보인다.
꽤 오래 그렇게 웃던 주인이 마침내 겨우 웃음을 멈추고 말한다.
“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모리씨. 당신은 참 솔직해서 좋아요.”
나는 어리둥절해져서 그런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화나지 않으셨어요?”
“아뇨. 전혀. 외려 기대했던 대답이랄까.”
“저 같으면 화날 것 같은데요. 역겹다는 소릴 들으면요.”
“역겨운 짓이 맞는데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요.”
주인은 몸을 숙여 내가 아까 바닥에 놓았던 머그컵을 집어 들었다.
“혹시....... 지어내신 이야기인가요?”
“아뇨.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한 짓은 아니지만.”
부엌 싱크대에 머그컵 두 개를 넣고 주인이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암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활짝 벌렸다.
“보세요.”
윤활젤을 바른 듯, 흠뻑 젖은 보지가 춤추듯 움찔댄다. 손으로 벌리자 보짓물이
길게 다리를 타고 흐른다.
“모두 이 암캐가 한 짓입니다. 첫 아이는 그렇게 주인의 노리개로 굴리다가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에게 빼앗겼지요. 둘째 아이는 팔아버렸습니다.
애기 보지를 좋아하는 독신남에게. 백일이 겨우 지난 애였습니다.
오천만원 받았다고 하더군요.”
주인은 쇼파 위에 놓아두었던 회초리를 다시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번들대는 암캐의 보지를 쿡쿡 찌르고 쑤시며 말했다.
“그런데도 이 보지를 보세요.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지요.
외려 자신이 한 짓을 듣고 이렇게 흥분해 있습니다....... 머릿속에 똥만 찬 암캐년 답지요.”
나는 멍하니 암캐의 보지를 응시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은 차라리 누군가의 음부라기보다 에어리언 같은 외계인의 입처럼 보였다.
보지 밖으로 당장 촉수가 튀어나올 것 같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영민님(이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이
직접 하신 일도 아닌데.......왜.......”
“동정하실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저 분을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추잡한 짓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암캐니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내...... 흥분된다는 생각만 했는걸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메조인 나에게 이 집의 주인과 암캐의 플을 관전하는 것은
흥분 그 자체였다. 나중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걱정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 말, 앞으로도 꼭 지키세요.”
“그 말씀은....... 다음에 또 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흘 뒤에 오세요. 토요일이니 시간도 넉넉하실 테고.”
사흘 뒤... 또 이 집에 온다...... 아니, 올 수 있게 되었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여, 나는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
좀 늦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연재해볼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수캐랑 교미를 그렇게 해댔는데도 임신 하나를 제대로 못 하나.”
암캐의 검은 눈동자에 두려움이 가득 차오른다.
“각오는 돼 있겠지.”
주인은 회초리 끝을 잡고 가볍게 힘을 준다. 휘어지는 것을 보니 물푸레나무 같다.
회초리를 허공에 한번 휘두르자 가벼운 소리가 난다.
소리가 신호였는지, 암캐는 몸을 돌려 엎드리고는 엉덩이를 높게 들어 자세를 잡는다.
휘익, 찰싹.
암캐의 이마에 희미한 주름이 잡힌다. 고통인지, 쾌락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다.
회초리가 계속해서 그런 암캐의 엉덩이 위로 떨어진다. 날카로운 파열음.
암캐는 희미하게 몸을 떨며 눈을 감는다.
애처롭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연분홍색 혀끝이 보인다.
스팽이 계속되었다. 암캐의 하얀 엉덩이 위는 어느 새 붉고 긴 흔적들로 덮여 간다.
처음에는 엉덩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점 허벅지 아래로까지 넓어진다.
회초리가 멈추었을 때, 나는 암캐의 엉덩이와 무릎 위쪽 허벅지에 붉은 자국이
가득 남은 것을 보았다. 하얀 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푸레나무가 아무리 연하고 잘 휜다고 해도 이 정도면 내일 아침 멍에 열상에
온통 너덜너덜해질 것 같았다. 주인은 그런 암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회초리로
이리저리 쓸어내린다. 으으, 하는 가는 신음소리가 암캐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암캐는 애원하는 눈으로 주인을 올려다본다. 스팽으로 호흡이 거칠어진 주인은
그런 암캐를 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마지막 한 번이야.”
주인의 누그러진 목소리에 암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진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다시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쁜 것 같다. 주인이 회초리로
암캐의 허벅지 옆을 탁탁 친다. 그게 신호였는지 암캐는 네 발로 기어
쇼파 앞의 낮은 테이블에 덥썩 몸을 얹는다. 배와 가슴이 유리판에 닿아
차가울 텐데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눈치다.
주인은 탁자 위에 상반신을 얹고 엉덩이는 높이 든 암캐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아까 회초리를 꺼냈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 긴 로프를 꺼냈다.
그리고 마치 짐짝을 고정하듯 탁자와 암캐를 둘둘 감기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암캐의 등 과 허리 사이에서 X자로 만나는 모양이기는 하나,
정성을 들인 본디지란 느낌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냥 말 그대로 암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것이 목적인 듯 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된 암캐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닥쳐. 개년아.”
그리고 그제야 주인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나를 의식한 행동이다. 주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얼굴에 정면으로 꽂힌다.
“차 한 잔 하실까요.”
나는 서둘러 네, 하고 대답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큼, 하고 헛기침을 하며 나는 그제야 깨닫는다. 집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내내 무섭도록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인은 부엌으로 간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가 하는 행동은 쇼파에 앉은 나에게 그대로 다 보였다.
전기포트로 물을 데우며 주인이 물었다.
“커피? 녹차?”
나는 아무거나 달라고 했다. 잠시 후 그가 나에게 건넨 머그컵 안에는
따듯한 커피가 들어있었다. 주인의 손에도 머그컵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서 있었고 나는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뭘 마시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그렇게 선 채로 탁자에 묶여 가볍게 할딱이는 암캐를 내려다보았다.
나도 그와 같이 암캐의 엉덩이를 바라봤다.
훤하게 드러난 보지와 똥구멍이 가끔씩 움찔거린다.
“난 애기 보지를 좋아합니다.”
뜬금없는 얘기에 놀란 나는 잔에서 입을 뗐다.
“아주 어린 보지는 제대로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꼬막 같지요.
뽀얗고 통통한 그걸 희롱하면서 가끔 손끝으로 입구를 벌려 주면,
대부분의 경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래요.
너무 어린 건 범할 수가 없지요. 적어도, 여섯 살은 되어야.
그 정도는 되어야 삽입이 되지요.”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다. 커피의 쓴 끝 맛이 역하다.
주인은 차를 한 번 홀짝이고는 말을 이었다.
“삽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짓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윤활젤을
써야 합니다. 공이 많이 들죠....... 손가락으로 넓히기 시작하긴 하는데,
어른 손가락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것에게 직접 자기 손가락을 넣게 하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마침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고...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린 보지는 개통할 준비가 다 된 거죠.”
나는 몸을 숙여 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십중팔구 피가 납니다. 성숙하지 않은 몸을 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꽉 끼는 질을 맛보면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암캐는 아무리 어려도 암캐라는 걸....... 모리씨.”
그가 날 부르는 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가느다란 어린 것이 신음을 내면서 허리를 흔드는 장면을 상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조련하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몇 개월이면 됩니다.
물론, 그 옆에는 어린 것의 어미도 있겠지요. 주인에게 딸년의 보지를 바친
행복한 암캐. 딸의 보지를 범하는 주인의 자지를 보면서 쾌락에 몸을 떨고 있을 암캐.......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암캐를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려는 겁니다.
암캐 몸에서 나고, 핏덩이 때부터 철저히 암캐로 교육받은, 뼛속까지 암캐인
육변기를 기르기 위해서.......”
주인은 말을 끊고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역겹지요?”
차고도 뜨거운 것이 확 얼굴로 치솟는다. 얼굴을 찡그리며 내가 말했다.
“네. 토할 것 같아요.”
주인이 입을 크게 벌려 웃는다. 별다른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몹시 유쾌해 보인다.
꽤 오래 그렇게 웃던 주인이 마침내 겨우 웃음을 멈추고 말한다.
“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모리씨. 당신은 참 솔직해서 좋아요.”
나는 어리둥절해져서 그런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화나지 않으셨어요?”
“아뇨. 전혀. 외려 기대했던 대답이랄까.”
“저 같으면 화날 것 같은데요. 역겹다는 소릴 들으면요.”
“역겨운 짓이 맞는데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요.”
주인은 몸을 숙여 내가 아까 바닥에 놓았던 머그컵을 집어 들었다.
“혹시....... 지어내신 이야기인가요?”
“아뇨.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한 짓은 아니지만.”
부엌 싱크대에 머그컵 두 개를 넣고 주인이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암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활짝 벌렸다.
“보세요.”
윤활젤을 바른 듯, 흠뻑 젖은 보지가 춤추듯 움찔댄다. 손으로 벌리자 보짓물이
길게 다리를 타고 흐른다.
“모두 이 암캐가 한 짓입니다. 첫 아이는 그렇게 주인의 노리개로 굴리다가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에게 빼앗겼지요. 둘째 아이는 팔아버렸습니다.
애기 보지를 좋아하는 독신남에게. 백일이 겨우 지난 애였습니다.
오천만원 받았다고 하더군요.”
주인은 쇼파 위에 놓아두었던 회초리를 다시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번들대는 암캐의 보지를 쿡쿡 찌르고 쑤시며 말했다.
“그런데도 이 보지를 보세요.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지요.
외려 자신이 한 짓을 듣고 이렇게 흥분해 있습니다....... 머릿속에 똥만 찬 암캐년 답지요.”
나는 멍하니 암캐의 보지를 응시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은 차라리 누군가의 음부라기보다 에어리언 같은 외계인의 입처럼 보였다.
보지 밖으로 당장 촉수가 튀어나올 것 같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영민님(이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이
직접 하신 일도 아닌데.......왜.......”
“동정하실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저 분을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추잡한 짓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암캐니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내...... 흥분된다는 생각만 했는걸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메조인 나에게 이 집의 주인과 암캐의 플을 관전하는 것은
흥분 그 자체였다. 나중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걱정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 말, 앞으로도 꼭 지키세요.”
“그 말씀은....... 다음에 또 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흘 뒤에 오세요. 토요일이니 시간도 넉넉하실 테고.”
사흘 뒤... 또 이 집에 온다...... 아니, 올 수 있게 되었다.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여, 나는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
좀 늦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연재해볼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