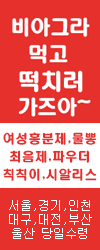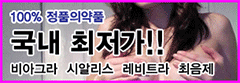Forgotten Battle, 러시아 하 ... - 2부 7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0-01-17 15:01본문
“후원보다 여자부터 치워야겠다”
인한이형이 가볍게 웃는다. 하긴 별일은 아니다.
“거 보소 아가씨가 왜 이렇게 곱다요”
“홍씨랑 김씨가 후원 한번 나가보시오 하긴 나가봐야 별일 없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당가요?”
“별일 아닐 것이오 박행수”
“내 도대체 모르겠소 여기 한량은 칼든 놈들한테 습격을 당한 것 같고 다친데는 없어보이나 아가씨 둘러메고 들어온 품이 몇놈 쥑이버리고 들어온 듯 한데 무슨 소리요?”
“길주야…”
“일단 여급들이나 달래야겠네요 행수아재 사람 하나 보내소”
“어이 노씨 함 나가보드라고”
“야”
별일 아니다. 우리를 노렸다면 나를 유인 할 것이 아니라 술에 골아 떨어지길 기다려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야 맞다. 나를 유인한 것은 내 실력을 보고 싶어서일 것이고… 단지 누가 보냈는가가 궁금할 뿐…
“별일 아니오 몇놈 와서 베어버렸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거면 나 하나 불러내지 않고 축시 지나 쳐들어오지 않았것습니까?”
“그야 글타만서도”
후원에 나갔던 홍씨랑 김씨가 하릴없이 들어온다. 미리 대기하고 있었겠지…
“어찌 되었소?”
“핏자국만 낭자한 거시 시체는 고사하고 살덩이도 없더이다.”
“물뿌리고 왔어유”
“그럴 줄 알았소. 박행수 아까 그 과수댁이 어땧다고요?”
“거 귀신이 곡할 노릇일세 그랴… 벤 놈은 있는데 베인 놈은 없어지고 핏자국만 낭자하더라…”
“거 애태우지 말고 이야기 해보소. 궁금해서 견댈 수 없구만…”
“거 윤덕영(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윤덕영은 왕의 외척으로 정권을 독점한 인물이다. 2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각의를 받아 왕실의 장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합방" 설득한 자로 막대한 재부를 획득한 척족이기도 하다)이네 털다가 왜경놈들에게 쫒기는 상황부터 다시 이야기 하리다.”
…
윤덕영의 창신동 집은 고색창연하긴 하나 의외로 외진 곳에 있었다. 척족이였으되 망국의 척족이라 권세는 오간데 없고 남은 것은 재산이라… 그 잘난 재부 가리려 들어간 곳이 창신동일 터 아흔아홉칸 대갓집이되 사대문 안에 널린 것이 고대광실이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종로 뒤켠이니 뉘눈에 띨까…
근처 이름없는 구릉에서 내려다본 윤덕영 본가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문간 청지기는 피해가면 될 것이오. 내외가 없는 터 윤덕영은 안방에서 잘 것이다. 사랑방은 냉기가 서늘한 것이 불피우는 흔적조차 안보인다. 안채 옆 몸종방엔 몸종과 서방이 함께 기거하고 열댓놈의 머슴들이 사는 행랑은 안채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몸종 내외만 제압하면 끝이다. 머슴이 열댓이라 하더라도 두어놈만 때려잡으면 될일이오 수가 틀리면 육혈포를 내면 그만이지…’
생각을 정리한 박행수는 일행을 내려보내고 날랜 홍씨와 눈을 붙였다. 인시쯤이면 사위가 한가할 터 대문을 피해 담치기 내댓번이면 바로 안채니 무엇이 걱정이랴…
인시… 다닥다닥 붙은 창신동 골목길을 뛰어 박행수는 윤덕영의 집 담을 넘었다. 다람쥐 나무 타듯 포수 생활 20년에 발 소리 조차 나지 않는다. 홍씨 역시 앗쌀하다. 담을 내댓개 넘었을까… 바깥 몸종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떠그럴 놈 육질이라도 한 모양이지…’
- 땡그렁…
박행수는 미리 준비한 깡통을 댓돌위에 떨어뜨렸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 안채까지 들리진 않고 몸종 내외만 간신히 들을 정도…
“오밤중에 무에야?”
바깥몸종이 문을 연다. 몸종질로 20년이다. 안주인 바깥주인 숨소리만 들어도 일어날 터 깡통소리는 천둥인 것이다.
- 퍼어억
기다리고 있던 박행수의 손이 나갔다. 바깥몸종의 목울대에 박행수의 호구가 작열한 것이다. 몸종의 숨이 턱 막히면서 무너져내린다. 1~2시간 동안은 넋을 놓을 것이다.
- 우웁
방에 살그머니 들어간 홍씨도 안몸종의 목울대를 제압했다. 이제 방해될 것은 없다.
…
윤덕영은 떨고 있었다. 호랑이 권세라도 이미 이십여년전 이야기… 깜깜한 인시에 시커먼 장한 둘이 사시미칼을 들이미는데 현존하는 권세가라도 떨 터이다.
“이보게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무엇인가?”
“네놈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물의 일부와 불효불충한 네놈의 오른팔이 필요할 뿐이다.”
“도…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으니 모…목숨만 살려주게…”
“네놈 덕에 이천만 동포가 압제에 떨고 있느니라… 그리고 불쌍한 우리 황제폐하는 어찌할 것이냐?”
“그…것은…”
“네 이놈!!!”
- 짝!!!
박행수의 손이 올라갔다.
“네놈의 권세로 왜놈들과 맞서 싸웠어도 지금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노릇인 거늘 어디서 핑계인가!!! 내 뜻하는 바가 있어 한손만 거두어 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여…기 10만원이 있네. 이 돈이면 자네들 하는 운동에도 보탬이 되고 또 가족 부양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이 늙은이 남은 낙이 난 치는 것이라네 제발 손만은…”
- 우우우우웁
- 퍼억
벌어진 입에 꺼내놓은 옷쪼가리를 쑤셔 박고 주먹으로 미간을 후려쳤다. 혼이 빠질 것이다. 이 정도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지…
- 툭
잘려나간 손이 애처롭다. 박행수는 방바닥을 딩구는 윤덕영을 버려두고 홍씨와 돈을 주섬주섬 담아 돌아섰다.
“평생을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아라. 네 불구 몸을 네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똑바로 알려주도록 해라”
“우어어어어업….”
…
- 삐이이익
박행수가 문을 피해 담을 뛰어 내리자 마자 호각이 울린다.
‘앗차 전통(전화)을 끊는 것을 잊었구나…’
사방에서 호각소리가 울려퍼진다. 저 멀리 회중전등 빛이 올라오고 발자국 소리가 다급하게 퍼져나간다. 윤덕영의 처가 신고를 한 모양이다. 돈은 무겁고 발자국 소리는 좁혀 오는데…
“홍씨 남쪽으로 튀어 신시경 남산에서 보세”
“행수어른 몸 챙기시오.”
“뛰어~”
일단 박행수는 눈앞의 담을 뛰어 넘었다. 가능한 근처에 있는 편이 낫다. 순사들은 도주하는 자를 찾느라 멀리 돈다. 앞집 담을 넘고 옆집까지만 가도 안전하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순사들이 돌아와 집집들이 수색할 때 수색이 끝난 집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어차피 수색중에는 어수선하니 담을 뛰어넘어도 상관없다.
첫담 넘은 집을 건너 건너편 집에 들어갔다. 사위가 조용한데 툇마루께 불이 들어온다. 순사들의 호각 소리에 집주인이 놀란 모양이다. 박행수는 문간 뒤로 숨어들어갔다.
“오밤중에 왠일이래…
가는 목소리... 호롱불 켜고 창호문을 열고 나온 것은… 여자였다.
To be contined…
인한이형이 가볍게 웃는다. 하긴 별일은 아니다.
“거 보소 아가씨가 왜 이렇게 곱다요”
“홍씨랑 김씨가 후원 한번 나가보시오 하긴 나가봐야 별일 없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당가요?”
“별일 아닐 것이오 박행수”
“내 도대체 모르겠소 여기 한량은 칼든 놈들한테 습격을 당한 것 같고 다친데는 없어보이나 아가씨 둘러메고 들어온 품이 몇놈 쥑이버리고 들어온 듯 한데 무슨 소리요?”
“길주야…”
“일단 여급들이나 달래야겠네요 행수아재 사람 하나 보내소”
“어이 노씨 함 나가보드라고”
“야”
별일 아니다. 우리를 노렸다면 나를 유인 할 것이 아니라 술에 골아 떨어지길 기다려 칼을 들고 쳐들어왔어야 맞다. 나를 유인한 것은 내 실력을 보고 싶어서일 것이고… 단지 누가 보냈는가가 궁금할 뿐…
“별일 아니오 몇놈 와서 베어버렸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거면 나 하나 불러내지 않고 축시 지나 쳐들어오지 않았것습니까?”
“그야 글타만서도”
후원에 나갔던 홍씨랑 김씨가 하릴없이 들어온다. 미리 대기하고 있었겠지…
“어찌 되었소?”
“핏자국만 낭자한 거시 시체는 고사하고 살덩이도 없더이다.”
“물뿌리고 왔어유”
“그럴 줄 알았소. 박행수 아까 그 과수댁이 어땧다고요?”
“거 귀신이 곡할 노릇일세 그랴… 벤 놈은 있는데 베인 놈은 없어지고 핏자국만 낭자하더라…”
“거 애태우지 말고 이야기 해보소. 궁금해서 견댈 수 없구만…”
“거 윤덕영(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윤덕영은 왕의 외척으로 정권을 독점한 인물이다. 2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각의를 받아 왕실의 장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합방" 설득한 자로 막대한 재부를 획득한 척족이기도 하다)이네 털다가 왜경놈들에게 쫒기는 상황부터 다시 이야기 하리다.”
…
윤덕영의 창신동 집은 고색창연하긴 하나 의외로 외진 곳에 있었다. 척족이였으되 망국의 척족이라 권세는 오간데 없고 남은 것은 재산이라… 그 잘난 재부 가리려 들어간 곳이 창신동일 터 아흔아홉칸 대갓집이되 사대문 안에 널린 것이 고대광실이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종로 뒤켠이니 뉘눈에 띨까…
근처 이름없는 구릉에서 내려다본 윤덕영 본가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문간 청지기는 피해가면 될 것이오. 내외가 없는 터 윤덕영은 안방에서 잘 것이다. 사랑방은 냉기가 서늘한 것이 불피우는 흔적조차 안보인다. 안채 옆 몸종방엔 몸종과 서방이 함께 기거하고 열댓놈의 머슴들이 사는 행랑은 안채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몸종 내외만 제압하면 끝이다. 머슴이 열댓이라 하더라도 두어놈만 때려잡으면 될일이오 수가 틀리면 육혈포를 내면 그만이지…’
생각을 정리한 박행수는 일행을 내려보내고 날랜 홍씨와 눈을 붙였다. 인시쯤이면 사위가 한가할 터 대문을 피해 담치기 내댓번이면 바로 안채니 무엇이 걱정이랴…
인시… 다닥다닥 붙은 창신동 골목길을 뛰어 박행수는 윤덕영의 집 담을 넘었다. 다람쥐 나무 타듯 포수 생활 20년에 발 소리 조차 나지 않는다. 홍씨 역시 앗쌀하다. 담을 내댓개 넘었을까… 바깥 몸종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떠그럴 놈 육질이라도 한 모양이지…’
- 땡그렁…
박행수는 미리 준비한 깡통을 댓돌위에 떨어뜨렸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 안채까지 들리진 않고 몸종 내외만 간신히 들을 정도…
“오밤중에 무에야?”
바깥몸종이 문을 연다. 몸종질로 20년이다. 안주인 바깥주인 숨소리만 들어도 일어날 터 깡통소리는 천둥인 것이다.
- 퍼어억
기다리고 있던 박행수의 손이 나갔다. 바깥몸종의 목울대에 박행수의 호구가 작열한 것이다. 몸종의 숨이 턱 막히면서 무너져내린다. 1~2시간 동안은 넋을 놓을 것이다.
- 우웁
방에 살그머니 들어간 홍씨도 안몸종의 목울대를 제압했다. 이제 방해될 것은 없다.
…
윤덕영은 떨고 있었다. 호랑이 권세라도 이미 이십여년전 이야기… 깜깜한 인시에 시커먼 장한 둘이 사시미칼을 들이미는데 현존하는 권세가라도 떨 터이다.
“이보게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무엇인가?”
“네놈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물의 일부와 불효불충한 네놈의 오른팔이 필요할 뿐이다.”
“도…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으니 모…목숨만 살려주게…”
“네놈 덕에 이천만 동포가 압제에 떨고 있느니라… 그리고 불쌍한 우리 황제폐하는 어찌할 것이냐?”
“그…것은…”
“네 이놈!!!”
- 짝!!!
박행수의 손이 올라갔다.
“네놈의 권세로 왜놈들과 맞서 싸웠어도 지금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노릇인 거늘 어디서 핑계인가!!! 내 뜻하는 바가 있어 한손만 거두어 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여…기 10만원이 있네. 이 돈이면 자네들 하는 운동에도 보탬이 되고 또 가족 부양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이 늙은이 남은 낙이 난 치는 것이라네 제발 손만은…”
- 우우우우웁
- 퍼억
벌어진 입에 꺼내놓은 옷쪼가리를 쑤셔 박고 주먹으로 미간을 후려쳤다. 혼이 빠질 것이다. 이 정도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지…
- 툭
잘려나간 손이 애처롭다. 박행수는 방바닥을 딩구는 윤덕영을 버려두고 홍씨와 돈을 주섬주섬 담아 돌아섰다.
“평생을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아라. 네 불구 몸을 네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똑바로 알려주도록 해라”
“우어어어어업….”
…
- 삐이이익
박행수가 문을 피해 담을 뛰어 내리자 마자 호각이 울린다.
‘앗차 전통(전화)을 끊는 것을 잊었구나…’
사방에서 호각소리가 울려퍼진다. 저 멀리 회중전등 빛이 올라오고 발자국 소리가 다급하게 퍼져나간다. 윤덕영의 처가 신고를 한 모양이다. 돈은 무겁고 발자국 소리는 좁혀 오는데…
“홍씨 남쪽으로 튀어 신시경 남산에서 보세”
“행수어른 몸 챙기시오.”
“뛰어~”
일단 박행수는 눈앞의 담을 뛰어 넘었다. 가능한 근처에 있는 편이 낫다. 순사들은 도주하는 자를 찾느라 멀리 돈다. 앞집 담을 넘고 옆집까지만 가도 안전하다.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순사들이 돌아와 집집들이 수색할 때 수색이 끝난 집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어차피 수색중에는 어수선하니 담을 뛰어넘어도 상관없다.
첫담 넘은 집을 건너 건너편 집에 들어갔다. 사위가 조용한데 툇마루께 불이 들어온다. 순사들의 호각 소리에 집주인이 놀란 모양이다. 박행수는 문간 뒤로 숨어들어갔다.
“오밤중에 왠일이래…
가는 목소리... 호롱불 켜고 창호문을 열고 나온 것은… 여자였다.
To be contined…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