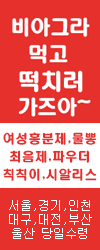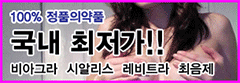강간 - Monster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0-01-17 12:31본문
강간 - Monster 1
괴물
그들은 날 괴물이라 부른다.
누구 하나 어긋남이 없이 괴물이라 한다.
나는 괴물이다.
그들은 모두 날 괴물이라 불렀고,
난 괴물이 되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난 괴물이 되었다…
괴물.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날 그렇게 불렀다. 내 얼굴에 괴물이라고 써 붙여진 것도 아닌데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그렇게 불렀다. 우리 집에 같이 살던 누나들도, 밤마다 드나들던 처음 보는 아저씨들도…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도 내 이름이 괴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만은 날 괴물이 아닌 주민이라 불렀다. 성도 없이 그냥 주민이. 그게 내 이름이였다.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난로 가에 집어 던져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평소 날 보는 눈빛에 미움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 평소에 엄마는 날 부르지 않는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술이라도 취한 날이면 날 꼭 껴안은 채 주민아~ 하고 엄청 젖은 목소리로 날 불러준다. 그럴 때면 난 너무나도 행복해서 오줌을 찔끔거리고 정신이 몽롱해 질 정도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엄마의 젖 내음은 너무나도 향기로웠고 엄마의 품 속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아빠? 난 아직도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다만 엄마 방을 드나들던 아저씨들 중 한 명이라고 추측 할 뿐이다. 그래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같이 살던 누나들에 비해 엄마 방에 드나들던 아저씨들의 수가 훨씬 적어 유추 해보기가 쉽다는 거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귀찮고 또 내가 아빠란 존재에 대해 그리 궁금해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사실 어렸을 땐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밤에 몰래 엄마 방을 훔쳐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들켜서 죽을 정도로 얻어 맞았지만, 그때의 광경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찌걱 찌걱 찌걱….
“아아앙~~아아~~하악~~~”
엄마는 발가벗은 채 마치 개의 모양으로 네발로 엎드려 있었고 이름모를 남자(덥석부리 수염에 몸집이 컸었다. 마치 산도둑 같이…) 역시 알몸인 채로 양 무릎을 세우고 앉아 엄마의 엉덩이 쪽에 바싹 붙어 엉덩이를 앞 뒤로 씰룩 대고 있었다.
“아아~~아아앙~~~”
엄마의 탐스런 유방이 아남자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렸고, 엄마의 입에선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아아~아앙~하악…뭐 이런 묘한 소리들)가 연신 흘러나왔다.
“으으..훅..훅…야, 좀 숙여봐…”
“하앙~ 아잉~ 힘들게…”
덥석부리 남자의 우악스런 손길에 엄마의 머리가 침대 위에서 눌려지고 그 순간 시야가 뒤쪽까지로 넓어진 엄마의 눈에 내 모습이 들켜버린 것 이었다. 날 보는 엄마의 눈빛은 당혹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아아~더~더~좋아요~아아아~~~”
“이…씹..할..년…훅..훅..훅…”
찌걱 찌걱 찌걱…
“아아아~~아아아아아앙~~~~~”
땀에 찌든 살과 살의 마찰음. 육욕에 미친 쾌락의 신음 소리. 남자는 절정에 도달 했는지 엄마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격렬히 마찰 시켰고, 엄마는 더욱더 달뜬 신음을 내질렀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날 향해 있었다. 나 역시 엄마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입으론 연신 좋아~ 좋아요~ 아아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눈엔 한 가득 분노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으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뜨뜻 미지근한 액체가 내 바지를 적시는 것도 몰랐다.
짜악!!! 퍽! 퍽! 퍽!
따귀로 시작된 구타는 내가 정신을 잃는 순간까지 계속 되었다. 처음에는 울면서 빌기도 해보았지만 나중에는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 밖으로 꺽꺽 대는 소리 밖에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분노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정신을 잃기 전 난 보았다. 엄마의 눈을…그 눈에 담겨진 슬픔을…백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그 눈빛을…평소 싸늘하기만 했던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가물가물 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눈빛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주쳤다. 그 눈빛 그대로의 엄마와…눈이 마주치는 순간 난 육신의 아픔을 잊고 웃을 수 있었다. 뭐, 웃는다 하더라도 흉측한 얼굴을 좀더 일그러뜨리는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테지만, 난 엄마와 시선을 마주친 채로 웃을 수 있었고 그걸로 행복했다.
다음날 내가 정신을 차린 곳은 엄마 침대 위였다. 엄마 침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엄마 몰래 한번씩 누워보는데(들키면 죽는다…), 너무도 푹신푹신 하고 부드러웠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이불의 감촉은 닿기만 해도 찌릿 하고 전기가 올 만큼 좋았다.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깬 후에도 일어난 척 하지 않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다. 들키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땐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눈을 재대로 뜰 수 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얼굴에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또 때리려는 줄 알고 흠칫 했지만 엄마는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아 주었다. 나는 놀라 눈을 아주 조금 떠서 실눈을 한 채 엄마를 보았다. 다행이 엄마는 잠을 자는 듯 했다. 그제야 나는 안심을 하고 엄마의 손길 대로 엄마의 품 속으로 파고 들었다.
엄마의 체온이 내 온 몸으로 전해졌고 벌거벗은 유방의 부드러운 감촉이 내 얼굴을 간지럽혔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엄마의 향긋한 내음과 귓가에서 마치 자장가 마냥 울리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 더 간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내 머리 속에 사진처럼 각인 시켰다.
괴물
그들은 날 괴물이라 부른다.
누구 하나 어긋남이 없이 괴물이라 한다.
나는 괴물이다.
그들은 모두 날 괴물이라 불렀고,
난 괴물이 되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난 괴물이 되었다…
괴물.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날 그렇게 불렀다. 내 얼굴에 괴물이라고 써 붙여진 것도 아닌데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그렇게 불렀다. 우리 집에 같이 살던 누나들도, 밤마다 드나들던 처음 보는 아저씨들도…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도 내 이름이 괴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만은 날 괴물이 아닌 주민이라 불렀다. 성도 없이 그냥 주민이. 그게 내 이름이였다.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난로 가에 집어 던져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평소 날 보는 눈빛에 미움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 평소에 엄마는 날 부르지 않는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술이라도 취한 날이면 날 꼭 껴안은 채 주민아~ 하고 엄청 젖은 목소리로 날 불러준다. 그럴 때면 난 너무나도 행복해서 오줌을 찔끔거리고 정신이 몽롱해 질 정도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엄마의 젖 내음은 너무나도 향기로웠고 엄마의 품 속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아빠? 난 아직도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다만 엄마 방을 드나들던 아저씨들 중 한 명이라고 추측 할 뿐이다. 그래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같이 살던 누나들에 비해 엄마 방에 드나들던 아저씨들의 수가 훨씬 적어 유추 해보기가 쉽다는 거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귀찮고 또 내가 아빠란 존재에 대해 그리 궁금해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사실 어렸을 땐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밤에 몰래 엄마 방을 훔쳐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들켜서 죽을 정도로 얻어 맞았지만, 그때의 광경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찌걱 찌걱 찌걱….
“아아앙~~아아~~하악~~~”
엄마는 발가벗은 채 마치 개의 모양으로 네발로 엎드려 있었고 이름모를 남자(덥석부리 수염에 몸집이 컸었다. 마치 산도둑 같이…) 역시 알몸인 채로 양 무릎을 세우고 앉아 엄마의 엉덩이 쪽에 바싹 붙어 엉덩이를 앞 뒤로 씰룩 대고 있었다.
“아아~~아아앙~~~”
엄마의 탐스런 유방이 아남자의 움직임에 따라 출렁거렸고, 엄마의 입에선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아아~아앙~하악…뭐 이런 묘한 소리들)가 연신 흘러나왔다.
“으으..훅..훅…야, 좀 숙여봐…”
“하앙~ 아잉~ 힘들게…”
덥석부리 남자의 우악스런 손길에 엄마의 머리가 침대 위에서 눌려지고 그 순간 시야가 뒤쪽까지로 넓어진 엄마의 눈에 내 모습이 들켜버린 것 이었다. 날 보는 엄마의 눈빛은 당혹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아아~더~더~좋아요~아아아~~~”
“이…씹..할..년…훅..훅..훅…”
찌걱 찌걱 찌걱…
“아아아~~아아아아아앙~~~~~”
땀에 찌든 살과 살의 마찰음. 육욕에 미친 쾌락의 신음 소리. 남자는 절정에 도달 했는지 엄마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격렬히 마찰 시켰고, 엄마는 더욱더 달뜬 신음을 내질렀다.
하지만 엄마의 눈은 날 향해 있었다. 나 역시 엄마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입으론 연신 좋아~ 좋아요~ 아아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으면서 눈엔 한 가득 분노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으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뜨뜻 미지근한 액체가 내 바지를 적시는 것도 몰랐다.
짜악!!! 퍽! 퍽! 퍽!
따귀로 시작된 구타는 내가 정신을 잃는 순간까지 계속 되었다. 처음에는 울면서 빌기도 해보았지만 나중에는 말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 밖으로 꺽꺽 대는 소리 밖에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질책도 어떠한 분노의 말도 하지 않았다.
정신을 잃기 전 난 보았다. 엄마의 눈을…그 눈에 담겨진 슬픔을…백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그 눈빛을…평소 싸늘하기만 했던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가물가물 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눈빛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주쳤다. 그 눈빛 그대로의 엄마와…눈이 마주치는 순간 난 육신의 아픔을 잊고 웃을 수 있었다. 뭐, 웃는다 하더라도 흉측한 얼굴을 좀더 일그러뜨리는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테지만, 난 엄마와 시선을 마주친 채로 웃을 수 있었고 그걸로 행복했다.
다음날 내가 정신을 차린 곳은 엄마 침대 위였다. 엄마 침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엄마 몰래 한번씩 누워보는데(들키면 죽는다…), 너무도 푹신푹신 하고 부드러웠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이불의 감촉은 닿기만 해도 찌릿 하고 전기가 올 만큼 좋았다.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깬 후에도 일어난 척 하지 않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다. 들키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땐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눈을 재대로 뜰 수 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얼굴에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또 때리려는 줄 알고 흠칫 했지만 엄마는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아 주었다. 나는 놀라 눈을 아주 조금 떠서 실눈을 한 채 엄마를 보았다. 다행이 엄마는 잠을 자는 듯 했다. 그제야 나는 안심을 하고 엄마의 손길 대로 엄마의 품 속으로 파고 들었다.
엄마의 체온이 내 온 몸으로 전해졌고 벌거벗은 유방의 부드러운 감촉이 내 얼굴을 간지럽혔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엄마의 향긋한 내음과 귓가에서 마치 자장가 마냥 울리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 더 간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내 머리 속에 사진처럼 각인 시켰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