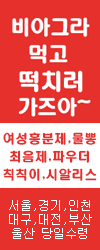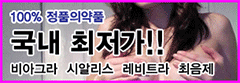남근석 - 2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20-01-17 12:55본문
남근석남편 우석의 고향마을엔 영험 하다는 남근석이 하나 있었다.
남자의 팔뚝만한 남근석이었는데, 마을 뒤편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의 계곡에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위 절벽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2미터 정도 높이의 작은 폭포가 있었고, 고인 계곡물을 옆으로 펼쳐진 넓은 바위위로 그 남근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몰랐지만 사람이 만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삼신할매가 만들어놓은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못 갖는 여자들이 그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대면 아이가 생긴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다.
영선은 그런 미신을 따라야 한다는 게 싫었다.
아무리 성욕이 왕성한 그녀였지만, 야심한 밤에 홀몸으로 그곳까지 가서 그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댄다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여자 홀로 계곡에 들어가 그런 음탕한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그토록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있어 그 행위는 음탕함이 아닌 성스러운 행동일 뿐이었다.
-
-
-
다음날 저녁.
영선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더운물로 목욕을 했다.
부엌에 마련된 큰 통에 더운물이 담겨 있었고, 영선은 그곳에 몸을 담그고 깨끗이 씻었다.
씻는 동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며 쉬지 않고 일렀다.
-몸을 깨끗이 해야 아이가 들어서는기라..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데이...
-우석이 그 놈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그래이. 꼭 니혼자 가야한대이..
-그라고 내가 주는 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믄 안되는기라.. 알긋제?
-거길 갔다오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하면 안된대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긋제?
-우석이 닮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빌어야 하는기라..
-계속 부벼야 하는기라. 하늘이 노래질때까제… 무슨 말인지 알제? 꼭 그래야칸대이
시어머니의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고 있었다.
영선은 시어머니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조차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지만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더니 펼쳐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 든 채로 뭐라 중얼거리며 영선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무당처럼 보였다.
영선은 소름이 돋아 물 속으로 더 깊이 몸을 담갔다.
의식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영선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수건을 내밀어 물기를 닦게 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뚜막 위쪽에 잘 개어놓았던 하얀 치마를 가져왔다.
하얀색 한복 속치마였다.
영선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그것을 받아 들었다.
“얼른 입고 나오그래이.”
영선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영선은 몸을 가렸던 수건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건네준 속치마를 입었다.
넓은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 같은 속치마였다.
머리위로 뒤집어쓰듯이 입으며 양 팔을 빼내고 아래로 끌어내리니 긴 치마자락이 땅에 닿을 듯이 떨어졌다.
가슴 앞쪽을 여미면서 똑딱이 단추를 채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룩한 젖가슴이 비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부엌에는 불빛도 어둡고, 거울이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선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못하고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바깥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석은 영선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왜..?”
“응? 아..아니..”
“말해봐. 왜 그렇게 놀라는데?”
“아..아냐. 아무것도..”
우석의 표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영선은 방으로 뛰듯 들어갔다.
말릴 겨를도 없었다.
방에 들어선 영선은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았다.
그 순간 영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하얀 속치마 안으로 속살이 그대로 비쳐 보이고 있었다.
풍만한 젖 무덤은 물론 아랫배 밑으로 자리잡은 역삼각의 검은 털 숲이 선명하게 비쳤다.
몸을 가린 옷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영선은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걸 입고 갈수는 없어.’
영선은 마당으로 나서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노려보았다.
그곳에 갔다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주의가 떠올랐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퍼뜩 가그래이.”
시어머니는 영선의 등을 떠밀었다.
영선은 남편 우석을 돌아보며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우석은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다.
아내를 뒤따르긴 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머님이 잠든 뒤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우석은 곧 뒤따르겠다는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영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남자의 팔뚝만한 남근석이었는데, 마을 뒤편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의 계곡에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위 절벽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2미터 정도 높이의 작은 폭포가 있었고, 고인 계곡물을 옆으로 펼쳐진 넓은 바위위로 그 남근석이 우뚝 솟아 있었다.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몰랐지만 사람이 만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삼신할매가 만들어놓은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못 갖는 여자들이 그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대면 아이가 생긴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다.
영선은 그런 미신을 따라야 한다는 게 싫었다.
아무리 성욕이 왕성한 그녀였지만, 야심한 밤에 홀몸으로 그곳까지 가서 그 남근석에 음부를 비벼댄다는 것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여자 홀로 계곡에 들어가 그런 음탕한 짓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그토록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있어 그 행위는 음탕함이 아닌 성스러운 행동일 뿐이었다.
-
-
-
다음날 저녁.
영선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더운물로 목욕을 했다.
부엌에 마련된 큰 통에 더운물이 담겨 있었고, 영선은 그곳에 몸을 담그고 깨끗이 씻었다.
씻는 동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며 쉬지 않고 일렀다.
-몸을 깨끗이 해야 아이가 들어서는기라..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데이...
-우석이 그 놈 데려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그래이. 꼭 니혼자 가야한대이..
-그라고 내가 주는 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걸치믄 안되는기라.. 알긋제?
-거길 갔다오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하면 안된대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긋제?
-우석이 닮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빌어야 하는기라..
-계속 부벼야 하는기라. 하늘이 노래질때까제… 무슨 말인지 알제? 꼭 그래야칸대이
시어머니의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고 있었다.
영선은 시어머니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조차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지만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더니 펼쳐 보였다.
그리고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 든 채로 뭐라 중얼거리며 영선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무당처럼 보였다.
영선은 소름이 돋아 물 속으로 더 깊이 몸을 담갔다.
의식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영선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수건을 내밀어 물기를 닦게 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부뚜막 위쪽에 잘 개어놓았던 하얀 치마를 가져왔다.
하얀색 한복 속치마였다.
영선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그것을 받아 들었다.
“얼른 입고 나오그래이.”
영선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영선은 몸을 가렸던 수건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가 건네준 속치마를 입었다.
넓은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 같은 속치마였다.
머리위로 뒤집어쓰듯이 입으며 양 팔을 빼내고 아래로 끌어내리니 긴 치마자락이 땅에 닿을 듯이 떨어졌다.
가슴 앞쪽을 여미면서 똑딱이 단추를 채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룩한 젖가슴이 비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부엌에는 불빛도 어둡고, 거울이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선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못하고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바깥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석은 영선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래졌다.
“왜..?”
“응? 아..아니..”
“말해봐. 왜 그렇게 놀라는데?”
“아..아냐. 아무것도..”
우석의 표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영선은 방으로 뛰듯 들어갔다.
말릴 겨를도 없었다.
방에 들어선 영선은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쳐보았다.
그 순간 영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하얀 속치마 안으로 속살이 그대로 비쳐 보이고 있었다.
풍만한 젖 무덤은 물론 아랫배 밑으로 자리잡은 역삼각의 검은 털 숲이 선명하게 비쳤다.
몸을 가린 옷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영선은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걸 입고 갈수는 없어.’
영선은 마당으로 나서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노려보았다.
그곳에 갔다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주의가 떠올랐다.
영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퍼뜩 가그래이.”
시어머니는 영선의 등을 떠밀었다.
영선은 남편 우석을 돌아보며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우석은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다.
아내를 뒤따르긴 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머님이 잠든 뒤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우석은 곧 뒤따르겠다는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영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남편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